
제6대 동시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지방선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선거가 역대 지방선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이전 다섯 번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유권자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였다. 대구의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64.4%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이다. 제2회 46.8%, 제3회 41.5%, 제4회 48.5%, 그리고 제5회에서는 45.9%를 보였다. 역대 평균 투표율은 49.4%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 유권자 2명 중에 채 1명도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낮은 참여율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61.4%이고, 대통령 선거는 76.9%였다. 대구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주권자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는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에 대한 효능감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트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현저하였다. 1998년의 제2대 지방선거부터 지난번 선거까지 대구시장 및 8명의 구청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지역구 선출 의원 거의 전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이후 중선거구제로 실시된 두 번의 기초의원선거에서도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대구는 한나라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묻지마'식의 투표 결과는 대구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는 평가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현직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쉽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 정치권이 지역에 덜 관심을 쏟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지방선거의 특징으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그 지역의 문제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쟁점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이 당시의 정국의 주요 현안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되었던 것이 천안함 침몰 및 그 처리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문제였다.
이처럼 중앙적이고 전국적인 이슈가 지방선거를 좌우하다 보니, 지방선거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있다. 대구에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 지역산업 개발, 대구'경북 경제통합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앙정치의 이슈가 지배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의제화하고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역대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무관심 하에 치러지고,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보이며, 그리고 중앙정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위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정책결정 수단이다. 지방선거를 지방민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지역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태도변화의 출발점이 내년 6월 4일의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세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ash@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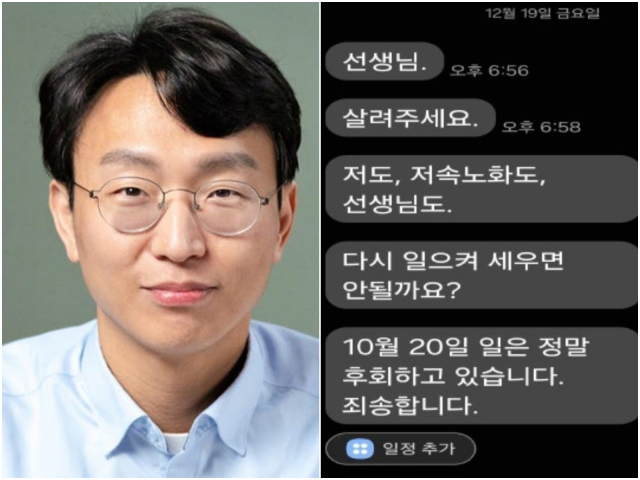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