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일요일은, '글루미 선데이'. 영화 제목처럼 우울했다. TV를 켜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마치 올림픽 스포츠 중계방송처럼 하루 종일 나왔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무려 66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수많은 노조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 대학생들이 무차별 연행됐다. 그 와중에 끌려가는 전교조 위원장의 사진이 내 가슴에 물음표와 느낌표 한 개씩을 찍었다.
우선 물음표. 이 사람은 철도노조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거기 있었을까? 사진을 들여다보다 말고 나는 스르르 학창시절의 추억 속으로 끌려들어 갔다.
나는 소문이 안 좋은 사학재단 소속의 여자 중학교에 다녔다. 좋은 교사도 많았지만, 재단에 봉투 바치고 들어왔나 싶은 이상한 교사들도 꽤 있었다. 공공연히 촌지가 오갔고, 과도한 체벌'성추행'성적 조작 등이 숱하게 일어났다. 필기시험 보는 과목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음악'미술'체육 등의 실기시험 성적은 거의 촌지 여부로 결정이 났다. 가난한 나는 반장 선거에서 '후보'조차 될 수 없었다. 고입 성적에 합산되는 체력장 시험에서도 우연히 감독관으로 만난 담임교사가 부잣집 딸의 공 던지기 점수를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든 말든 그는 개의치 않았고, 같은 반 제자인 내 성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재했다.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도 사립이었지만, 중학교 때처럼 터무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미션스쿨이라 기독교를 은근히 강요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으나, 장학금 받으려고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때라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요즘의 수능시험과 같은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점수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선시험 후지원' 제도와 달리 나는 그 이후 제도인 이른바 '선지원 후시험' 세대여서 지원한 대학 캠퍼스에 직접 가서 학력고사를 치르고 면접을 봐야 했다.
고3 담임 선생님은 남의 반 학생들까지 수소문한 끝에 내가 서울에서 숙식할 집을 주선했다. 그리고 행여 남의 눈에 띌까 나를 몰래 불러내어, 내 손에 흰 봉투를 들렸다. 몇 시간 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나를 어둠 속으로 호출하더니 곱게 접은 사각봉투를 주었다. 똑같이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으로 기차표도 사고 어묵도 사 먹으며, 생전 처음 가는 서울 나들이를 잘해냈다.
대학에 입학한 해인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나는 제자에게 몰래 촌지를 준 두 분 선생님이 모교의 전교조 창립 멤버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나중에 고3 때 한반이었던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역시 교사였던, 그 친구 어머니가 친구 손에 촌지를 들려 담임 선생님에게 보냈다. 물론 담임 선생님은 받지 않았다. 친구가 어머니에게 봉투를 돌려주었더니. 어머니가 붉으락푸르락 달아올라 그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돈이 적어서 그랍니까? 섭섭합니데이."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구는 어머니가 너무나 부끄럽고 싫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금액이 크든 작든 촌지를 받아 챙기는 교사였을 터.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촌지 액수에 구애받는 치사한 소갈머리를 가졌다고 단정했을 것이다. 그래도 뭐,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적어도 '종북' 딱지를 얻어 붙일 일은 없었으리라.
제 일만 챙기고 제 주머니만 불리는 교사에 비해 남의 일에 제 돈 쓰고 마음 쓰고 몸 쓰는 교사들은 걸핏하면 안 먹어도 될 욕을 가마니로 먹곤 한다. 교사뿐이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불순한 외부 세력'이란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상한 세상이다.
이제 느낌표! 그는 '연대'하려고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해변의 바위와 연대하여 기름 찌끼를 걷어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듯, 춥고 힘든 이와 연대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
박정애/강원대교수·스토리텔링학과 pja83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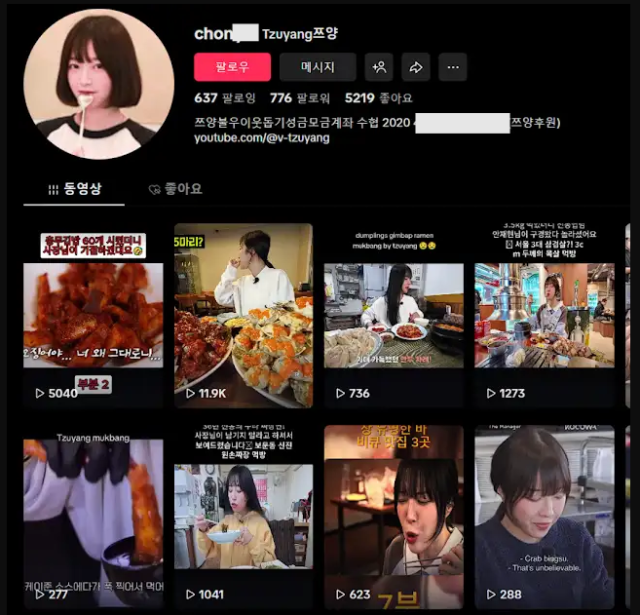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