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대기업 유치 실패 흑역사 교훈
'성장동력 산업=제조업' 사고 바꿔야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서비스업 유치
관련 서비스'기술 금융 정책적 육성을
한때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섬유산업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섬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1인당 GDP가 5천달러 수준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다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항의 철강산업은 1인당 GDP가 1만1천달러, 구미 전자산업의 경우 1인당 GDP가 1만5천달러에 이르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치에 이르고 나서 쇠퇴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장산업의 수명주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의 성장동력이라면 아직도 전자, 철강, 자동차나 정유화학산업이라고 떠올리는 이가 많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대구는 이러한 대규모 장치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필자의 경험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구의 대기업 유치 노력을 상기해 보자. 먼저 삼성그룹의 경우, 1994년 삼성자동차 부지를 대구의 성서공단 대신 부산의 신호공단으로 선택했고, 이후 상용차공장을 성서공단에 입주시키는 차선책을 내놨지만 2000년 결국 포기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합작해 성서공단에 만든 SSLM은 '대구 1호 대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으나 2014년 말 삼성은 이 사업에서도 철수하였다. 쌍용그룹의 경우도 1991년 쌍용자동차 제2공장 건립을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대 2천710㎡(82만 평)를 매입, 1995년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한 후 공정 36% 선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현재는 달성2공단으로 조성되어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3천1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두산중공업과 물산업 투자 및 공동 추진 사업에 대한 부속협약도 체결하였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물산업 세계 1위 기업'의 노하우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 전수해 국내 물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필자는 이러한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 실패의 흑역사가 공직자의 역량 부족 탓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구를 위해서는 분지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성장동력 산업이 제조업이라는 아날로그적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강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라는 갈라파고스의 생존법칙처럼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가 불리한 환경에 대구시가 적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작금의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자.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제조업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67%, 일본은 72%로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보다 높다. 아직 우리나라는 58%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컨설팅, 금융업, 유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다국적 컨설팅 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영국도 금융 허브인 런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업과 유통업, 홍보 서비스 위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제조업 글로벌화에 따른 연계업종(컨설팅, 금융, 홍보, 법률 등)의 수요 확대를 통해서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 우리가 잘하는 산업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구는 구미라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기기의 생산기지를 배후로 두고 있고, 전자공학도를 전국 최대로 배출하는 경북대, 뇌과학의 DGIST, 정보통신의 영남대에서 많은 인적 자원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배후산업과 지역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다.
이제는 제주에서 DAUM을 유치한 것과 같이 온라인 게임(넥슨, 게임빌, 스마일게이트), SMATO(옐로모바일, 500볼트), 핀테크(YAP, 쉐어앳)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위해 서비스 금융과 기술 금융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대구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상근/서강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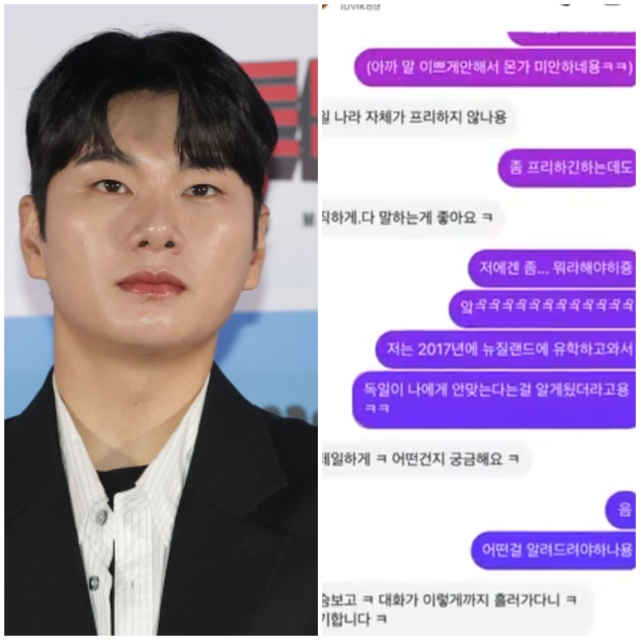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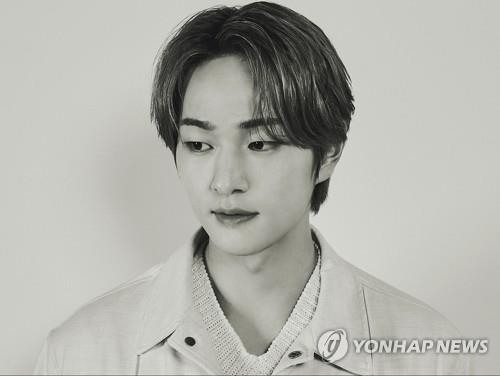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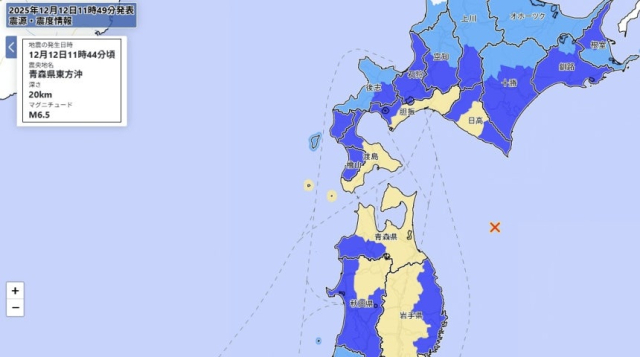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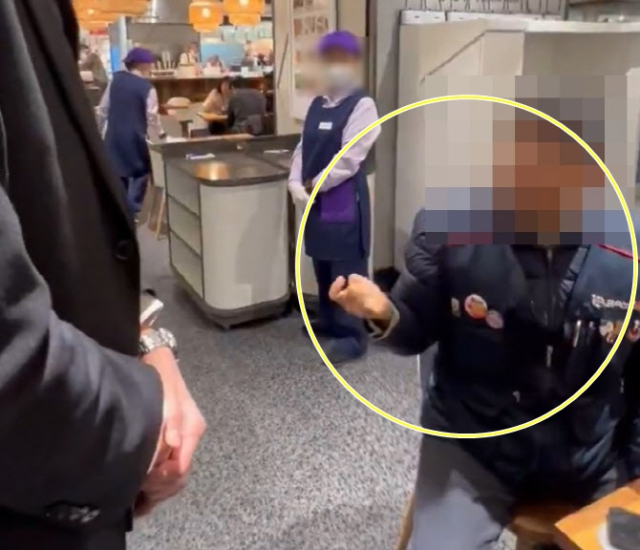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