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뭄이 심하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심은 콩은 돋아날 줄을 모른다. 도시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 오늘은 웃고 내일은 울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요즘 들어 하늘만 보고 산다. 햇살이나 달빛이나 별빛을 즐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비를 실어 내릴 구름이 한 조각이라도 하늘에 떴다 하면 그 구름에 목을 맨다.
농사꾼들이 보는 하늘은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과는 많이 다르다. 철에 따라 땡볕이 쬐는 하늘이 좋을 수도 있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로 날 갤 줄 모르는 하늘이 좋을 수도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장마철인데 이렇게 날마다 햇볕만 쨍쨍 들면 하늘이 원망스럽다.
'칠갑산'이라는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다. '콩밭 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는다.' 가끔 우리 공동체에 일손을 도우러 온 도시내기들이 묻는 때가 있다. '왜 콩밭을 꼭 땡볕 속에서 매야 돼요? 시원한 저녁 무렵이나 비 내릴 때 매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대로 두면 콩이 먹고 자라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콩보다 더 웃자라서 햇볕을 가려 콩 농사를 망치게 되는 잡초는 호미로 뿌리째 긁거나 파내 햇볕에 말려야 한다. 저녁 무렵에 김을 매서 제자리에 두면 밤새 이슬을 받아 되살아나기 십상이다. 비 오는 날 밭에 들어가면 김을 매더라도 흙이 뿌리에 달라붙어 되살아날 걱정이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흙이 다져져서 밭을 망치기 쉽다.
지난해도 가뭄이 들어 콩은 심을 종자도 건지지 못하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비가 안 내리는 날씨가 이렇게 오래 이어지면 밭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도 거덜 날 판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다.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요즈음에는 빛바랜 말이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사람 치고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무서운 만큼 고마운 줄도 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곧잘 입에 올린다. 고마운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데도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고맙다'는 말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내가 알기로 '감사'라는 말은 일본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온 한자어다)
'고맙다'는 말은 '고마+ㅂ다'가 한데 묶인 말이다. 'ㅂ다'는 '같다.', '닮았다.', '비슷하다'는 뜻을 지닌 '말끝'이다. 그리고 '고마'는 '곰', '검', '김', '가마', '개마', '금와', '거미', '구미'와 말뿌리가 같다. 모두 하늘을 가리키는 우리 옛말이었다. 그러니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하늘과 같습니다'라는 말이다.
하늘은 가끔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늘 고마운 존재다.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나는 일손 도우러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고맙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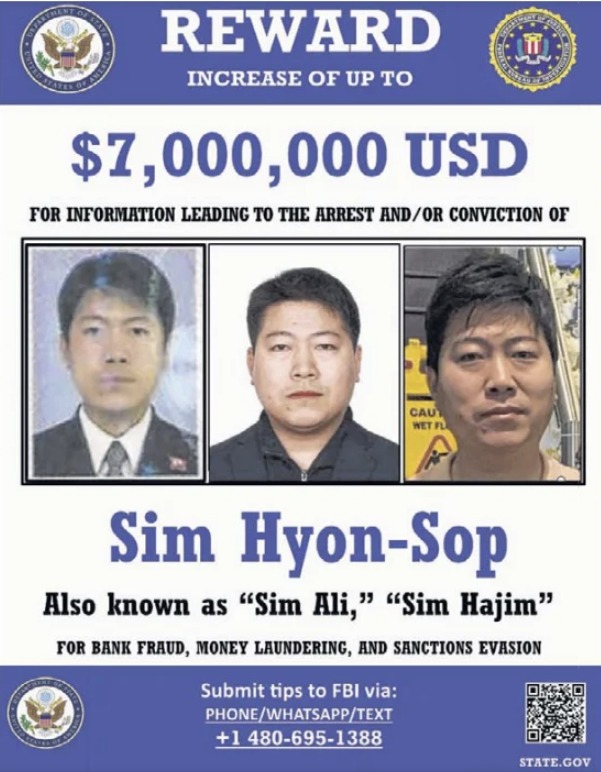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이혜훈 장관' 발탁에 야권 경계심 고조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대통령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만에 이만큼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