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년 6개월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했다. 지척에서 보고, 또 용산 및 여의도 등 정계 인사들을 통해 들으면서 윤 대통령을 알아나갔다. 말과 행동에 거침과 격의가 없다 보니 다소 거칠고 투박해 보이고, 여기에 강한 자신감과 소신까지 묘하게 겹쳐지면서 대중적 호감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줄기차게 개혁, 안보, 이념, 한일관계 회복 변화 등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대세력이 많아졌다. 불의라고 생각되면 타협하지 않는 성정도 고집불통으로 비치면서 의외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한 몫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강점인 진정성과 열정, 성과가 희석되고 반감돼 실제 하는 만큼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극적이거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는 발언·행보를 조심하는 분위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최근 굵직한 이슈에서 잇따라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하다. 그러나 이참에 더 변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첨언한다.
윤 대통령을 위기로 몬 원인을 들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출범 때부터 강조한 소통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통은 윤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라 최대 약점이 됐다. 그 책임은 먼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덜 듣고 많이 얘기하는 소통 스타일 때문이다. 소통이 양방이 아니라 일방으로 이뤄진 탓이다.
국정 운영에 누구보다 열심이고, 다방면에 지식도 풍부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과제나 행사 등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전문가 도움도 받고 관련 책도 읽는 등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정확히, 세세히 알고 지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혼자 대부분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그러기 위해선 믿어야 한다. 참모를, 부처를,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니 혼자 다 짊어지고 결정하려고 한다. '내가 더 많이, 더 잘 알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조금 못 미덥더라도 믿어야 하고 맡겨야 한다. 믿지 못해 지시하면 수동적이 된다. 시키는 일만 한다. 그 이상,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 바쳐 일하지 않는다.
전략 부재도 아쉽다. '용산'의 기획이라고 알려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그렇다. 야당 텃밭인데다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사면복권된 당사자를 곧바로 후보 공천한 것부터가 오판이다. 거기에다 주민들도 누군지 모르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을 대거 동원해 무의미한 인해전술로 헛심만 쓰다가 참패를 한 건 더 문제다.
전략 없이 판만 크게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자충수가 됐다. 차라리 후보 혼자 고군분투하는 전략으로 갔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설득력 있다. 그런데 이번 실패는 윤 대통령에게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리꽂으면 '필패'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내년 총선 참패는 윤 대통령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언·직언할 수 있는 참모 등 측근을 옆에 둬야 한다. 아닌 줄, 안 될 줄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측근은 측근이 아니다. 앞서 예를 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귀 멀고 눈 멀게 하는 측근들은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버럭, 호통만 쳐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구중궁궐이 싫어 청와대도 들어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굳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리모델링해 들어온 이유다. 그런데 용산에서도 여전히 인의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면 갖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가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부디 이참에 더 변해서 위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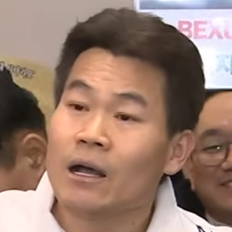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