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갈한 주거공간배치가 돋보이는 고택에 들면 무언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푸근함이 찾아온다.
따뜻한 목재의 질감이 안정감을 주는 툇마루에 앉아 둘러보는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목가적 풍경은 여유롭기까지 하다. 세월이 갈수록 더 오롯해지는 기둥과 서까래의 빛바랜 정취는 그 어떤 화려한 색의 순도보다도 진하다.
앞뒤가 탁 트인 대청마루에 올라 장지문을 열어젖히자 나지막한 뒷동산은 자연 그대로 한 폭의 동양화가 된다. 환경친화적 삶을 구현했던 사대부가의 선비정신이 아침이슬처럼 함초롬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 속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차가 삭풍의 날카로움을 밀어낸다.
훈훈한 온기에 고개를 돌려보면 낮은 담장 사이로 난 조그만 쪽문이 앙증맞게 눈에 든다.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정(精)의 가교였으리라.
그 쪽문 너머 일상의 수레바퀴에 얹혀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삶은 매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 같았다. 마음도 늘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그건 이렇게 했더라면…', '그 때는 왜 그랬던지…'하는 회한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기에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희망을 걸어 보는 게 또한 우리네 마음이다.
잘 가꿔진 한옥에서는 세속의 번잡함도, 못 다했던 한해의 후회도 잠시 접어든다.
한옥이 사람 살기에 제격인 까닭은 일단 집안에 들어서도 답답하지가 않도록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장지문이나 여닫이 문 하나를 열면 바로 땅과 자연이 맞닿아 있다. 비가 오는 정겨운 소리, 바람이 부는 스산한 느낌, 눈 내리는 밤 장독에 쌓여가는 적설의 무게마저 감지할 만큼 자연과 근접한 주거공간이 한옥이다.
계절의 변화뿐 아니라 절기와 맞춰지는 시간의 흐름까지 한옥이라는 공간에서는 삶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시골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한옥체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수더분한 안주인이 반기는 수애당
一자형의 정침(제사를 지내는 한옥의 몸채)과 ㄱ자형의 고방채(창고, 부엌, 온돌방이 연결된 사랑채)로 된 전형적인 조선말기 건축양식을 띤 고택인 수애당은 임하댐 건설로 20여 년 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남향의 솟을대문을 지나 안쪽 담장 사이에 난 예쁜 중문을 넘자 너른 마당엔 아궁이를 달구는 군불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나 고향집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당호인 수애당(水涯堂) 편액이 걸린 마루에 앉자 맞은편 고방채의 홑처마와 용마루선이 단아하고 곱게 다가온다. 미리 연락을 받아서인지 찻상을 든 안주인 문정현(40)씨가 반갑게 맞았다.
"저의 집에서 머물렀던 분들은 모두 하룻밤 자고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임하댐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수애당은 해가 일찍 지고 일찍 뜬다.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깊이 잠을 들고 대신 아침엔 새소리에 일찍 깨인다는 게 문씨의 귀띔이다.
"옛 구들이 놓인 한옥 방의 따뜻함도 도심 속 찜질방에 비할 바가 아니죠. 가족체험의 경우 가장이 직접 장작을 패서 군불을 지피면 밤새도록 온 가족이 단잠에 빠질 수 있어요."
이른 아침 임하댐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떠오르는 햇살을 향해 비상하는 새들의 도약은 수애당 한옥체험에 따라오는 보너스. 임하댐이 한눈에 드는 정자에 올라 새해의 결심을 수면에 깊게 새겨도 좋을 성 싶다. 낮에는 마당에서 투호나 널뛰기나 굴렁쇠놀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수애당 옆엔 행랑채와 안채, 사랑채 및 가묘가 고스란히 보존된, 300년이 넘는 전주 류씨 무실종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종택에는 종부 한 사람이 기거한다.
수애당(054-822-6661)은 11개의 한옥 방(4만~9만원)을 개방하고 있으면 아침식사(5천원)도 제공된다.
◆가문의 역사와 선비정신의 산실 '종택'
'사대부 집에는 3년에 한 번씩 금부도사가 드나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의성 김씨 내앞종가에 전해오는 가언(家言)이다. 요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부패혐의로 검찰을 들랑거리는 것과는 달리 임금에게 바른 소리를 함으로써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면 사대부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꼿꼿한 선비정신과 서슬 퍼런 칼날 아래에서도 할 소리는 해야 하는 사대부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일면이다.
그래서 일까. 내앞종택은 집 구조마저 특이하다. 안방이 사랑채보다 외부로 드러나 있고 사랑채에 이어진 부속채들은 윗층은 서고, 아래층은 헛간인 2층 구조를 하고 있다.
또 ㅁ자형의 안채와 一 자형의 사랑채가 행랑채와 이어지면서 전체가 巳자형을 만드는 독특한 건축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16세기에 종택이 한 번 불탄 후 학봉 김성일이 중국사신으로 갔다가 북경의 상류층 주택 설계도면을 갖고 와 새로 지었기 때문이다. 종택을 돌아들면 270년 된 회화나무가 가문의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내앞종택이 엄격하고도 높은 양반의 도덕성을 강조했다면 묵계종택은 청백리의 상징이다.
연산조에 홍문관부제학을 지낸 보백당 김계행이 낙향해 터를 잡은 묵계종택은 건물의 비례가 훌륭하고 구조가 짜임새 있는 한옥으로 400년이 넘는 세월에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지탱하고 있다. 대문 왼편에 역시 수령이 270년 됐다는 상수리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성리학자의 집답게 묵계종택 뒤편을 돌면 묵계서원이 나온다. 도산서원에 비하면 그 규모야 초라하지만 입교당 앞 읍청루를 오르면 발아래로 묵계리 들녘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진다.
종택을 돌아봄은 단순히 고가의 풍취를 느끼기보다는 그 속에서 살았던 선비들의 정신을 한 수 배운다는 점에서 발품이 그리 아깝지는 않다.
◆고택에 스며있는 한옥의 건축미
팔작지붕의 누마루가 한옥의 멋스러움을 잘 드러내는 소호헌은 사람 인(人)자의 맞배지붕을 한 부속 방과 어울려 전체 모양은 T자 형태를 하고 있다. 청이끼가 낀 낮은 담장을 너머 엿본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누마루 뒤를 돌면 소박하면서 단아한 한옥의 구조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서재로 지은 한옥이라서 그런지 특히 누마루의 겹처마와 서까래가 만들어내는 선의 배치가 곱다. 겨울바람이 차갑지만 금세라도 누마루에 올라 서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만큼 정겨움이 묻어난다.
광산 김씨 유일재 고택은 지은 지 400여년이 넘고 관리가 안 된 듯 외관이 많이 훼손돼 있지만 낮은 산자락 중턱에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의 정침과 사랑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랑채는 행랑채와 연이어 지붕이 날개모양으로 튀어나온 양익사(兩翼舍)로 돼 있어 고건축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
사진·정재호 편집위원 newj@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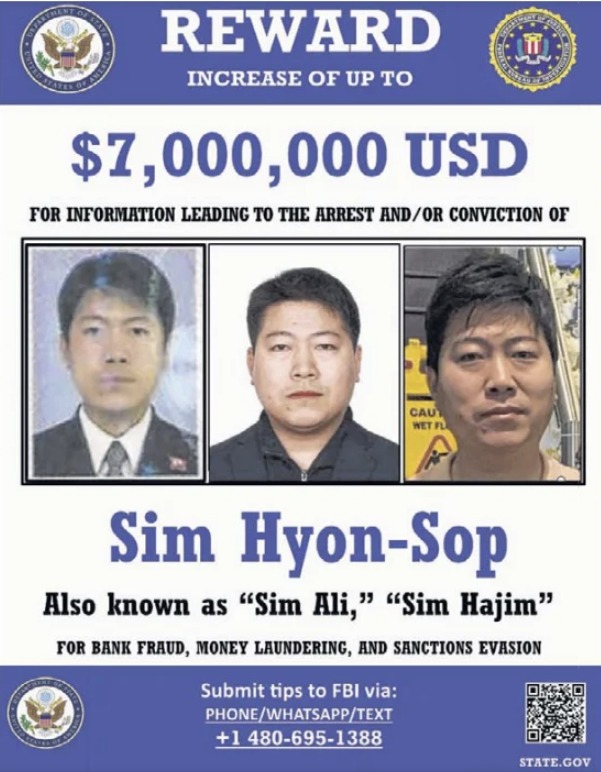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尹 "공소장 딱보니 코미디" 1시간 최후진술…'체포방해' 내달 16일 선고
[사설]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결국 면피용 작전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