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생이던 1960년대 변변한 시청각 자료도 없었고, 심지어 교과서 대신 프린트물로 공부하던 때였다. 책이나 환자 사진도 없이 그냥 강의로만 환자 모습을 상상하면서 수업시간을 보냈다. 지루하고 어려웠던 피부과 강의를 서순봉 교수는 중요한 요점만 기억에 남게 할 정도로 명강의를 했다. 가령 만성태선이라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태선은 나무나 돌에 붙은 이끼같은 모양이니 오래 돼 이끼모양으로 두꺼워진 피부병을 지칭한다'는 식으로 환자 진을 보지않고도 이해하도록 했다.
서 교수는 한국 진균학(곰팡이학) 창시자로 연구에 매진했다. 1960년대 초 당시 인간에 전염되는 곰팡이균에 감염된 짐승이 오지로 갈수록 많았다. 그 털을 구하러 산간 벽지의 소시장, 외양간, 농장 등을 며칠씩 누비고 다녔다. 대구 칠성시장 등 동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녔다. 남들이 보기에는 의사라기보다는 소 장사의 모습이었으리라.
당시 유행하던 어린이 머리털 버짐(두부백선)의 균검사를 위해 전국 고아원과 초등학교를 찾아 머리털을 수집해 곰팡이를 배양했다. 한국에 제대로 된 약이 없는 탓에 서 교수가 직접 만든 약을 발라주기도 했다.
대구경북에서 창궐했던 나병 진료를 위해 이동진료를 많이 다니던 시절 이야기이다. 당시 시골에 변변한 진료시설이 없어 다리 밑이나 숲 속, 헛간 등에서 적당히 의자와 책상을 놓고 진료와 검진을 하기도 했다. 가끔 진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여자 환자를 진찰해야 할 때는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하는 웃지 못할 경험도 많았다.
1960년대 경주 물천면의 한 초등학교에 나환자 자녀들이 다니고자 할 때, 다른 학부모들에 의해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나병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서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전염력이 전혀 없음을 며칠씩 설득하고 이해시켜 해결한 적도 있었다.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1970년대 초 나환자 진료로 유명한 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에서 외국에서 온 신약으로 치료했는데, 환자 얼굴이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 환자는 자신을 정상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약을 줬다고 오해해서 흉기를 들고 서 교수 자택에서 난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서 교수는 오랫동안 약의 좋은 점을 들어 설득하고 약을 복용하게 해 결국 치료에 성공했다.
김수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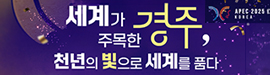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
대구 찾은 이진숙 "지금은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생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