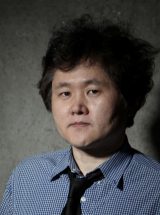
미술관 보이드 공간에 심은 산딸나무에 새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 그 조용한 기적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테라스 불도 꺼둔 채, 나는 한 달 남짓 그들 곁에 머물며 동행자가 돼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무더운 날씨에 새끼는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였고, 부모 새가 다가오면 기다렸다는 듯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어느새 내 하루의 리듬이 됐고, 그 작은 생명의 반응은 하루를 여는 알람처럼 다가왔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은 있어도, 늘 돌아왔기에 다시 마주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제도, 오늘도 그 자리는 비어 있다.
빈 둥지를 바라보니 생각이 많아진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다가갔던 걸까.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다 놀라게 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떠날 시간이었던 걸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마음 한편엔 묘한 공허가 남는다.
그 둥지는 우연히 발견됐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하얀 천 조각 같은 것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안에 새와 보금자리가 있었다.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신비롭고 고요한 경험이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술관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나무 위에는 둥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땐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이번엔 달랐다. 짧았지만 새 생명과 함께한 시간은 오롯이 내 안에 남았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한다. 새끼가 자라 독립을 준비할 때, 먹이와 안전을 찾아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때, 혹은 번식이 끝나 더는 머물 이유가 없을 때. 어떤 경우든 그 떠남은 준비된 것이며,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본 그 새가 새끼였다면, 이제는 충분히 자라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조용한 비상을 마음 깊이 응원한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주면 좋겠지만, 새는 한 번 떠난 둥지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삭막한 도심 속, 삶의 터전을 잠시 빌려 머물렀던 그 작은 생명은 떠났고, 그 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 자연의 자리를 좁혀 가며, 개발과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히 그 위를 보행한다. 둥지는 잊히고, 그 자리에 깃든 기억은 사라진다. 떠난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는 그 침묵을 오래도록 붙잡는다.
우리는 머물고 떠나며, 잊히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