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용진(73·전 경북도문화재연구원장)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연구실을 지키고 있었다. 제법 널찍한 연구실엔 각종 책들이 꽉 들어차, 바닥에까지 쌓인 책과 자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윤 교수는 지난 7월 경북도문화재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날때 까지 40여년간 문화재 관련 일을 해온 대구 역사 전문가. 하지만 윤 교수가 고고학을 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에 이끌려서 였다.
1960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에서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던 윤 교수가 중학교 은사였던 당시 경북대 박물관 박을령(경북대 수학과)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이 고고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됐다.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윤 교수에게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것. 이 때문에 당시 전국 대학 박물관 최초로 고분을 발굴하는 데에 동참하게 됐다.
고고학에 흥미를 느낀 윤 교수는 독학으로 경북대에서 강사생활을 하며 인류학, 고고학 등을 가르쳤다. 1963년 사학과 교수로 발령이 나면서 고고학과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엔 고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인이 한명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한두 사람 뿐이었으니 영남지역 고고학을 개척한 셈이죠." 윤 교수의 연구는 한국 고고학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기록 없이 유물을 마구 파헤쳐 윤 교수는 고고학자로서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일본사람들은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고분을 마구 파헤쳤어요. 그리고 가치있는 유물들을 국외로 빼돌리기도 했고요."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유물 발굴에 열심이었지만 유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1970년대만 해도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리곤 '잠깐 보자'면서 양해를 구하고 공사장에 들어가 유물을 살폈죠. 그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이런 열정 덕분에 대구 역사의 중심지로 알려진 달성공원 내 연못에서 기원전부터 퇴적된 유물을 발견, 대구역사의 기원을 밝혀내기도 했다. 윤 교수는 "수백 수천년간 묻힌 것을 처음 볼 땐 짜릿한 흥분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 후 윤 교수는 1980년 고고인류학과가 신설되면서 고고인류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경북대 박물관장을 10년 넘게 역임한 후 1994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현 영남문화재연구원)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 '대구의 초기 국가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을 발표, 대구지역에서의 사회변동을 연구하는데 학문적 자극이 되기도 했다.
요즘 윤 교수는 평생 연구해온 대구역사에 대한 정리를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역사 기록 이전의 대구사회를 정리할 겁니다. 자료도 저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지요. 대구는 역사가 참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최세정기자 beacon@imaeil.com 사진 : 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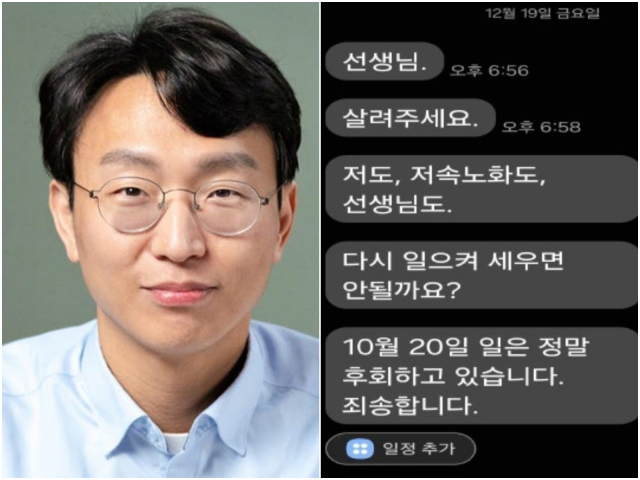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