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엄마랑 제일 친해. 우리는 친구잖아?" 일곱 살 아이의 말에 나는 괜히 뜨끔했다. 아무리 친해도, 연주가 다가오면 내 머릿속은 음악으로 가득하니까.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메트로놈 소리가 맴도는 날이 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살짝 미안해진다.
나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정확히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자 밥풀 붙은 티셔츠를 입고 유치원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아이 옆에서 활을 들고, 간식도 챙기며 '육아와 연습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꿨다. 지금은 그런 꿈은 부서졌고, 일과 육아를 완전히 분리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도 내가 '온전히' 옆에 있을 때 더 안정적이고, 나는 아이가 없는 시간에 활을 들 때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등원 시간은 내게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황금 시간이다.
하지만 연주 3일 전쯤 되면, 그 황금 시간도 모자라기 시작한다. 집안은 살짝 어수선해지고, 나는 조용히 선언한다. "그래, 이번 주는 나쁜 엄마로 간다." 약간 방목형, 약간 미안한 얼굴, 그리고 "괜찮아, 이번 주만 봐줘. 주말엔 같이 네가 좋아하는 그림책 열 권 읽자" 같은 자기합리화. 며칠 간 아주 나쁜 엄마가 되어도 괜찮다고, 나는 나를 설득한다.
우리는 부부가 육아를 나눈다. 공연이나 리허설이 있는 날엔 아빠가 하루 종일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린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도 있다.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고, 일정에 따라 활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연 전날 잡힌 리허설이나 갑작스러운 섭외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정이 많은 예술가에겐 여전히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 유연한 돌봄이란 이름은 있지만, 현실에선 '먼저 예약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곤 한다.
예술가 엄마도 바란다. 하루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무대에서 실컷 불태우고, 라면 하나 끓여먹고, 조용히 누워 있기"를.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예술이고, 경력 단절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아이도 어느새 나를 닮아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고, 어느 날은 드레스 입고 무대에 선 엄마를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했다. 그 그림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아이 눈에 내가 여전히 괜찮은 엄마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연습이 끝난 뒤 치아가 보이는 웃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간다. 아이도 깔깔 웃는다. 나는 오늘도 그 둘 사이, 드레스와 방목 사이 어딘가에서 엄마이자 음악가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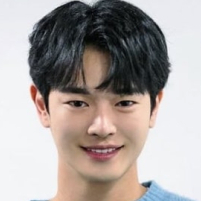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