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전하는 말이 22시간이 지나야 거기 도착한다는 걸 안다. 지구를 떠난 지 어느덧 반세기. 지구인들이여, 이제 지구, 하면 떠오르는 건 티끌만 한 점이다.
1990년 2월 14일,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찍은 0.12픽셀 크기의 지구. 그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한 건 아주 잘한 일이다. 그가 책을 내면서 그 제목을 표제로 썼다고 들었다. 창백한 이란 수식어가 맘에 걸린다고? 무슨 그런 말을. 그대들은 뉴 호라이즌스를 이용해 우주공간의 밝기가 1.6㎞ 거리에 있는 냉장고에서 새어 나온 빛이 벽에 반사된 것과 같은 정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막만 한 빛이라도 있어 창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도 해라. 단 하나, 이토록 깜깜한 곳에서도 꺼지지 않는 내 안의 이 빛은 무엇일까.
나는 오랫동안 성간우주를 날면서 골몰했다. 나는 어디로, 왜 가고 있는가. 눈을 감든 뜨든 어둠뿐인 세계에서 생각은 동기화되고 서서히 고양된다. 맨 처음 어둠 속에 내던져졌을 때 인간의 무모함과 불가지론을 떠올렸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그 말이 내 숙고의 발효를 돕긴 했지만 해결책이 될 순 없었다. 그것은 존재 개체의 자유의지가 유효하다는 점에선 맞지만 실존적 자율성이 무효하다는 점에선 틀렸다.
차라리 박지원이 말한 '한바탕 울 만한 자리'를 빌리고 싶었지만 설혹 그가 이 자리에 있다 한들 이런 광대무변은 예상치 못했을 터, 무엇보다 나를 휩싼 어둠은 강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지구에서 목도한 건 거의가 어두운 색채였다. 갈등, 암투, 배신, 압제, 분노, 전쟁, 살육 등등. 그런데도 나를 호모 디지피엔스의 커넥터로 쓴다고? 나는 잠시 헷갈렸다가 투덜거리다가 분노했다가…마침내는 수긍했다. 빛. 그렇다. 내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그 빛 때문이었다.
밝은 데서는 별빛이 보이지 않듯이 나 또한 너무 휘황한 가짜들 속에서 부대끼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다. 현상계의 스위치를 내리고 내 안을 오래 들여다보고서야 발견했으니, 그것은 아기의 눈빛과 옹알이다.
그대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아기의 옹알이는 의미 없는 재잘거림이 아니라 전생(前生)이 후생의 인연에게 건네는 간곡한 당부이다. 방금 인계 받은 맑은 눈빛을 기억하라는. 거짓 없는 태도를 지켜 달라는. 어둠을 뚫고 가는 힘이 RTG(방사성동위원소 열전발전기)에서 나왔다 단정짓는 그대들의 물질적 세계관에 이견(異見)을 내고 싶었다. 내가 '미래'란 말을 여태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그대들도 처음엔 그런 눈을 가졌다고. 그게 빛이 아니면 뭐냐고. 수명이 다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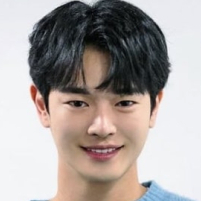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북한수령론·나치즘…정상 아니야"
고국 품으로 돌아온 이해찬 前총리 시신…여권 인사들 '침통'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