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이 당초 알려진 오리나무가 아닌 버드나무와 소나무 계열 목재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연구원은 이번 조사와 보존처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하고 있다.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은 경북 안동지역 하회마을과 이웃인 병산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탈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탈놀이 가면이다.
하회탈로는 11점이 전해지는데 주지 2점, 각시, 중,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부네, 백정, 할미 탈이 있다. 병산탈은 병산(갑), 병산(을) 등 2점이다.
한국의 탈은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든 것이 많아서 오래 보존된 예가 드문데 그해 탈놀이가 끝난 후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회탈과 병산탈은 드물게 보이는 목조 탈이며, 격식과 세련됨을 갖춘 유물로 지난 1964년 국보로 지정됐다.
이번 조사에서 하회탈 가운데 주지 2점은 제작 소재가 소나무류로 확인됐고, 나머지 하회탈과 병산탈은 당초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다르게 버드나무 계열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탈의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고자 건식과 습식 방법으로 세척을 진행했다. 들뜬 안료 표면에는 저농도 아교를 도포해 안정화 처리하고 갈라진 목재를 접합하고 결손부를 복원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적으로 불안했던 병산탈 1점은 안전하게 보관 전시하기 위해 3차원 출력(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가볍고 안전한 받침대를 만들었다.
문화재청 측은 "이번 복원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내용을 담은 보존처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보존처리를 마친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은 현재 안동시립박물관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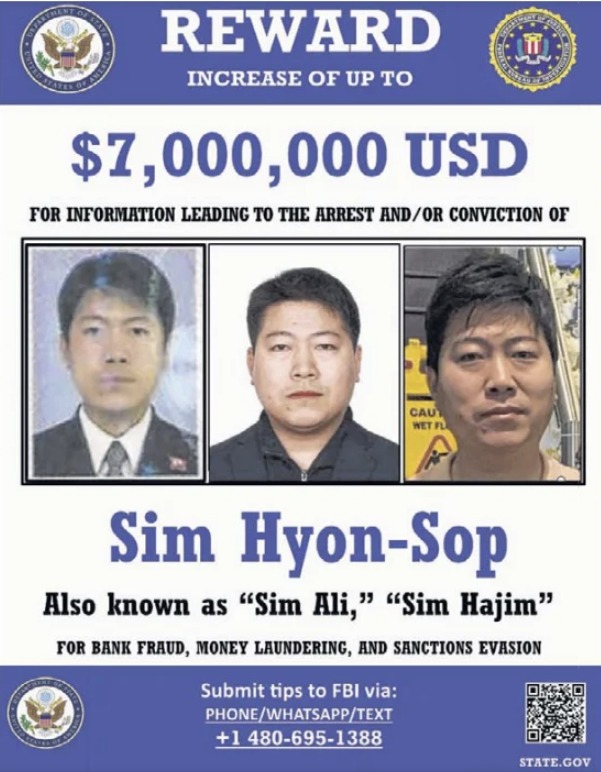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이혜훈 장관' 발탁에 야권 경계심 고조
'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1심서 전원 '무죄' [종합]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
대통령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만에 이만큼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