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롱나무 아래서〉
한여름 땡볕 아래, 원추화서圓錐化序 배롱나무
자잘한 꽃잎들 산란하는 붉은 치어 같다
툭툭 불거진 흰 뼈들 사이
맨발로 걸어가는 힘줄이 도드라진다
다닥다닥 어지럽게 핀 꽃잎을 달고
멀미하는 나무들
바람이 지날 때마다 천 개의 소리를 낸다
피었다 졌다 다시, 졌다 피었다
휘어진 가지마다 백 일 동안 꽃 피운다
배롱나무 자잘한 꽃무늬 일렁이며
긴 그림자 그늘도 백 일이다

<시작 노트>
배롱나무 꽃차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네 인생을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 나뭇가지마다 수많은 꽃잎을 매달고 여름 햇볕을 정면으로 견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지적인 꽃이랄 수 있겠다. 그날도 그랬다. 친정 오라버니 하늘로 떠난 후, 오랜만의 외출이었는데 앞이 캄캄했다. 멀미하듯 주저앉은 곳이 하필 배롱나무 아래 벤치였다. 여름 땡볕은 이글거리며 공원을 잠식하는데, 배롱나무 가지 사이 붉은 물결로 건너오는 바람이 내는 소리를 들은 듯도 하였다.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이야기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써야 한다.' 마치 천 개의 종소리가 일시에 울리듯 들숨과 날숨으로 여름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 후, 내게 배롱나무는 그해 여름의 아픈 기억이자 뜨거운 목숨의 새로운 의지로 각인 되었다. 비록 백 일 동안의 화관이지만 그것이 꽃의 일생이었으니 그 그늘도 내겐 살아가는 힘이라고 가르쳐 준다. 올여름에도 나는 배롱나무 아래서 왜 삶은 뜨겁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서성일 것이다. 좀 더 천천히 배롱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도 올려다보는 여유를 이제는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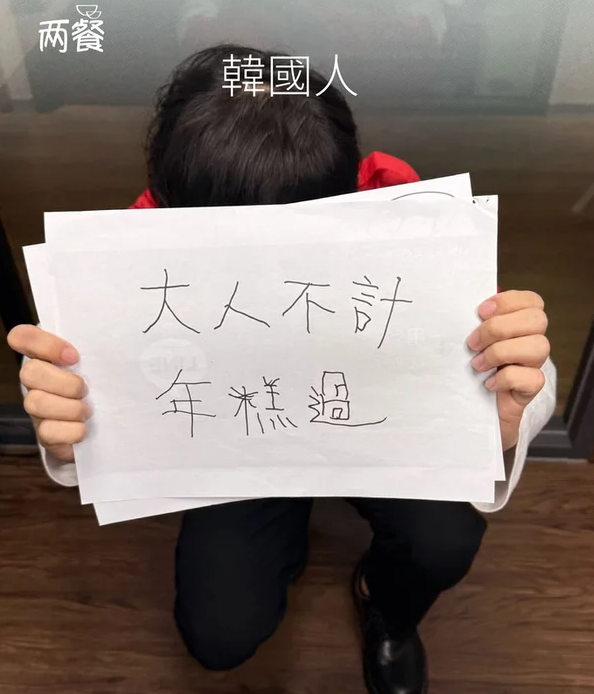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