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 1958년에 지었다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의 앞 부분이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3명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가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했다. 겨울비 속에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울었다. 빗소리와 흐느낌이 서로 다른 소리로 애도했다. 한 소방관은 영결식의 조사에서 "화재 출동 벨 소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반장님들, 늠름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반장님들이 그랬듯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겠다"고 했다.
소방관들은 그렇다. 순직한 동료를 가슴에 묻은 채, 출동해야 한다. 그들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가장 뒤에 나온다. 사람들은 순직 소방관을 '영웅'으로 추앙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애도한다. 특진, 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안전 대책 발표. 그러다 며칠 지나면 잊는다. 반복되는 '순직 소방관 애도 매뉴얼'이다.
한 해 평균 5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400명 넘게 다친다. 위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열화상카메라 등 생명을 지켜 주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현장에 뛰어든다. 미국에는 '투 인 투 아웃' 규정이 있다. 현장에는 최소 2명이 들어가 붙어서 활동하고, 밖에는 유사시 동료를 구할 최소 2명의 예비 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현장 재량에 맡긴다.
정치권이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현실화를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색·구조에 쓸 무인 로봇 개발 지원을 밝혔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소방관 순직 때마다 이런 대책들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소방관이 불구덩이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텐가? 소방관의 안전은 '기도'가 아닌 '예산'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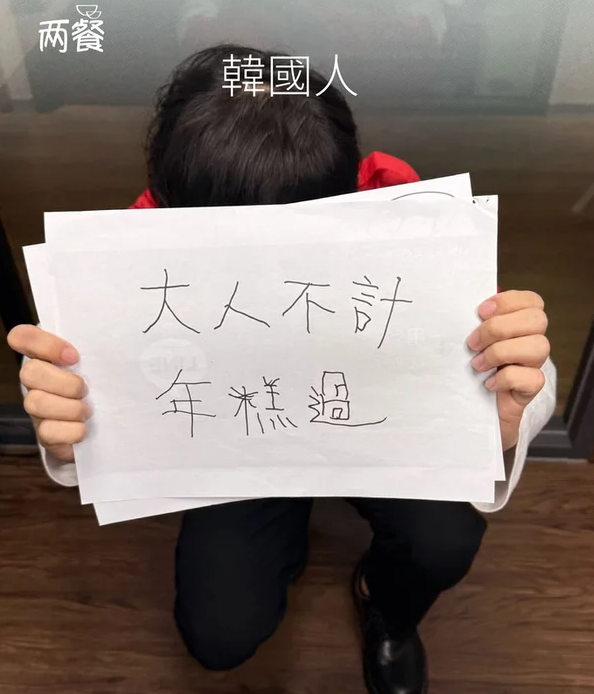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통합 무산·신공항 표류…"TK 정치권 뭐했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영상]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