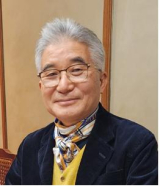
"한 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多富院(다부원)/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彼我(피아) 攻防(공방)의 砲火(포화)가/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아아 多富院은 이렇게도/大邱(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나/조그만 마을 하나를/自由(자유)의 國土(국토)안에 살리기 위해서는/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이 황폐한 風景(풍경)이/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고개를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머리만 남아 있는 軍馬(군마)의 屍體(시체)/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戰士(전사)/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움직이던 生靈(생령)들이 이제/싸늘한 가을 바람에 오히려/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多富院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이 가련한 주검에 무슨 安息(안식)이 있느냐/살아서 다시 보는 多富院은 죽은 者(자)도 산 者도 다 함께/安住(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시인 조지훈은 1950년 9월 26일 공군 종군문인단 일원으로 6·25전쟁 다부동 전투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절규했다. 2013년 가을 필자는 왜관지구, 다부동(칠곡), 적성리(문경), 포항지구, 안강지구(경주), 영천지구 등 영남지역 6·25 격전지를 취재하면서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多富院에서'라는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다. 매년 8월이 오면 수능시험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多富院에서'와 함께 유학산이 생각난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다부리)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조선인민군)이 치열하게 혈전을 벌인 전투현장이다. 다부동은 대구와는 불과 22km 떨어져 있다.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구가 점령될 수 있으며, 경주-울산-부산이 위험해진다.
한미연합군은 그래서 6·25 당시 제2의 수도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 마산-왜관-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군 1사단(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남쪽에 사령부를 두고, 북한 주력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낙동강 중부 전선인 '303고지(자고산,칠곡군 왜관읍 석전리)-328고지(석적읍 포남리)-숲데미산(숲이 깊은 산이란 의미석적읍 망정리)-유학산(석적읍 성곡리-가산면 학산리)'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최후의 방어선을 쌓고 총력을 기울여 사수했다.
한미연합군은 8월 21일 저녁 이곳에서 벌어진 6·25 최초의 전차전 볼링앨리 전투(The Battle of the Bowling Alley)를 통해 대구로 진격하던 북한군 제13사단을 괴멸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마침내 국군은 23-25일 유학산을 탈환함으로써 북한의 '8월 공세'를 막아냈다. 30여 년만의 가뭄과 무더운 날씨(37℃)에 치러진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대구를 사수한 것이다.
다부동을 병풍처럼 감싸안고 있는 유학산(遊鶴山839m) 정상에 있는 유학정에 오르면 대구 북구 일대가 보인다. 유학산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형상. 정상 700m 부근에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그런 산세로 다부동 전투 당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아홉 차례의 탈환전 중 아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곳이다. 정상에서 적 포병이 대구를 공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탈환해야 했다.
한때 다부동 전투 현장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학생들의 교육 장소였다. 학생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이곳을 방문해 '다부동전적기념관' 옥상에 올라 유학산을 보면서 '제1사단의 후퇴와 전투'라는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때로는 직접 유학산을 등산하면서 전투를 학습했다는 것. 필자는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은 이처럼 우리의 호국 유적지를 답사하며 안보 교육을 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유학산 정상에 '유학정'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팔공산과 금오산 일대의 빼어난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유학산을 등산한단 말인가. 유학산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 우리 국군의 결사대들이 그 얼마나 스러져갔던가. 강원도 철원의 아이스크림 고지 다음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이다. 유학산은 결코 싸구려 관광지가 아니다. 피로 물든 호국유적에 전망대를 세울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날의 함성을 들으며 온몸으로 호국을 체휼하는 역사의 현장이니 더욱 그렇다.
삼국시대의 천생산성, 고려시대의 냉산산성(숭신산성), 조선시대의 가산산성이 왜 이 일대에 있었던가. 영남 제일의 전략적 요충지인 유학산, 다부동은 우리 군과 전 국민의 살아 있는 안보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부동 전투에 대한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라도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진지와 참호 등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 입으로만 안보를 떠드는 시대는 지났다.
조한규(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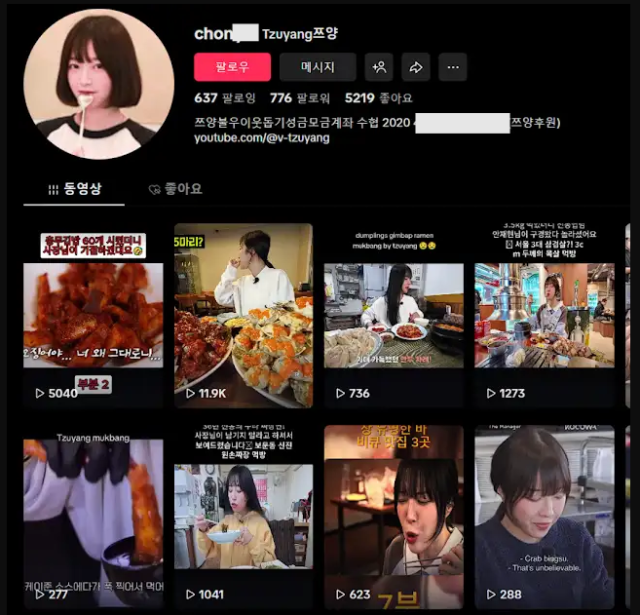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